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주영 교수 연구팀은 근감소증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위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체질량 지수(BMI) 30 이상은 ‘키로 보정한 근육의 절대량’, 30 미만은 근육량 대비 복부지방량인 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8~2011년 한국인 1만7870명을 대상으로 사지 근육량을 ▶키 ▶체중 ▶체질량 지수 ▶체지방을 보정한 지표 ▶근육량과 복부지방의 비율 등 총 5가지 지표로 나눠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비교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각 지표가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따졌다.
그 결과, 비만도에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30 미만으로 고도비만이 아닐 때 심혈관질환을 잘 나타내는 지표는 ‘근육량 대비 복부지방량’으로 확인됐다. 즉, 근육 자체의 양이 줄어들 때보다는 근육량에 비해 복부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돼있을 때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았다. 연구팀은 "근육량과 전신 체지방의 비율보다 복부 지방의 비율이 정상체중군의 심혈관질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키로 보정한 근육의 절대량’ 지표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이다.
신체 근육량이 줄면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대사증후군을 포함해 허혈성 심장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이런 근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겉보기에 말라보이지만 실은 비만인 이른바 '마른 비만'이 많은 한국인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를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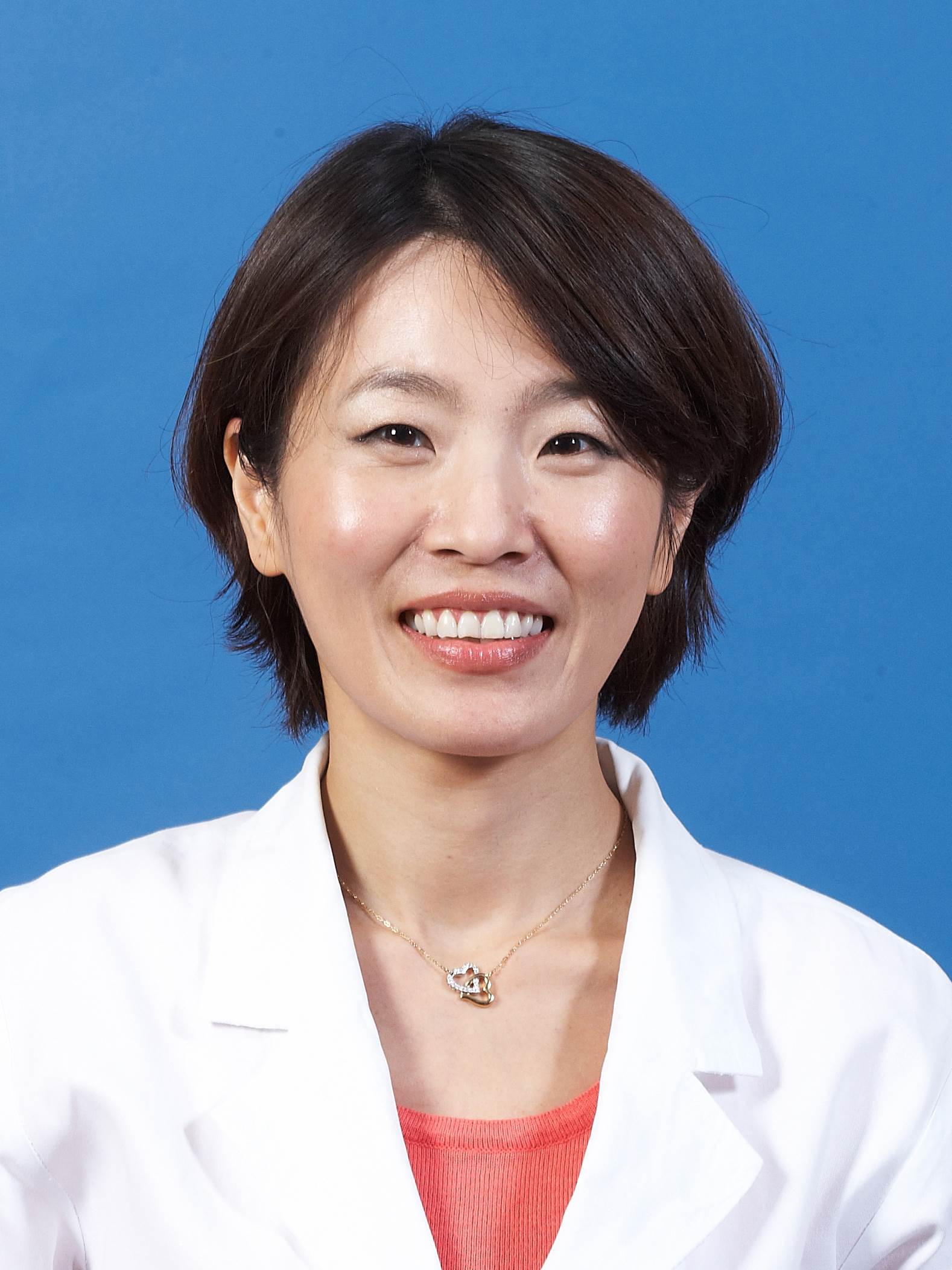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주영 교수 [사진 분당서울대병원]
이어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증명된 결과는 향후 정상체중군에 속하지만 대사학적으로는 비만인 위험군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가 발행하는 SCI급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 저작권자 © 중앙일보에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