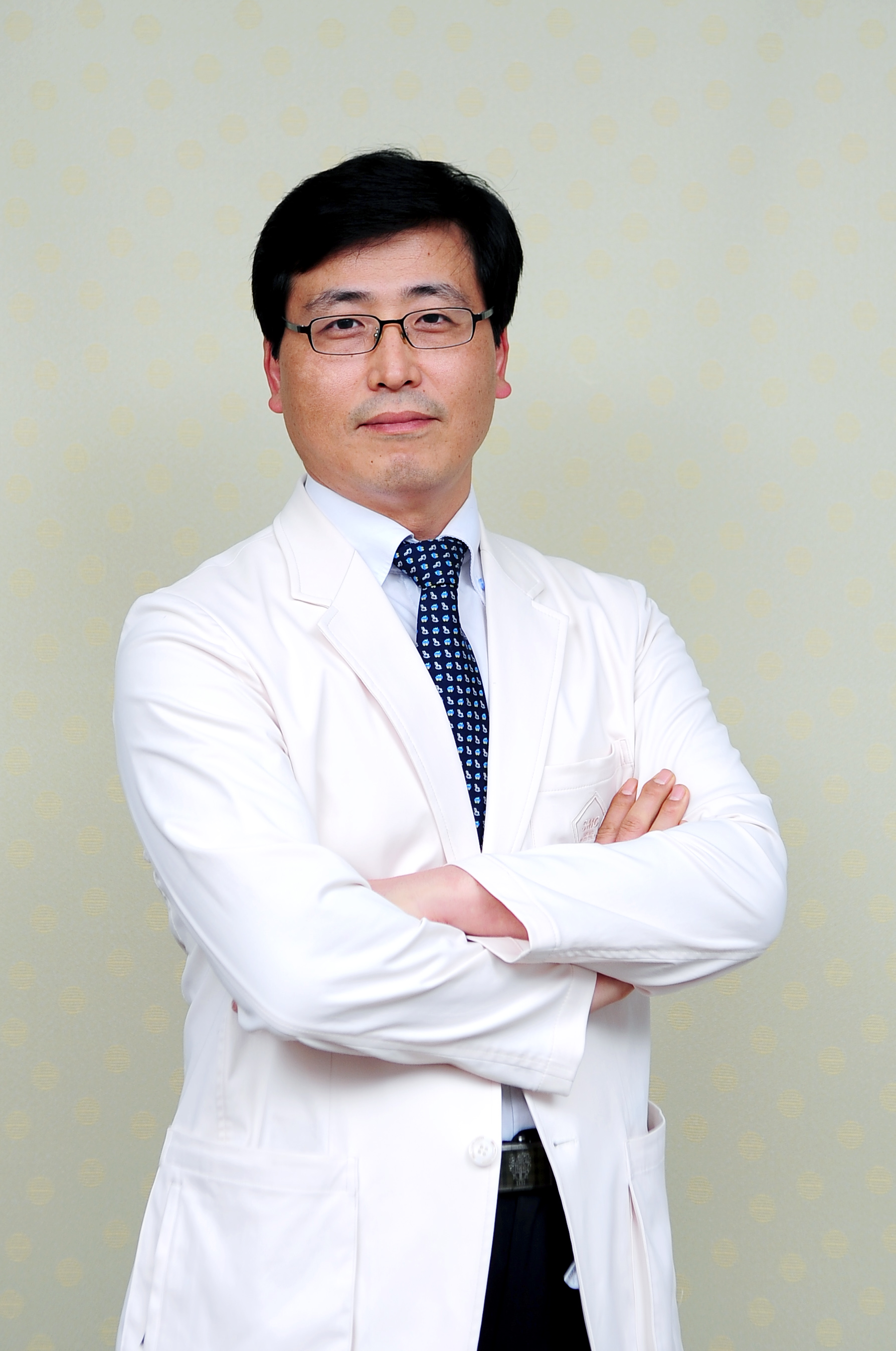
5월 30일은 세계다발성경화증의 날이다. 올해는 ‘함께 모이자’(#JoinUsTogether)라는 해시태그를 슬로건 아래 국가별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다발성경화증 환우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통해 다발성경화증을 알리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적 신경면역계 질환이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돼 뇌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가는 신경 자극의 전달이 방해를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2600여 명 정도로 희귀 질환에 속한다.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위에서 염증이 수시로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진행 과정도 다르다. 특히 많은 환자가 초기에는 시신경 혹은 척수(등골)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시각 장애, 사지 감각 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안구통이 동반된 시각 장애 혹은 팔다리의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다발성경화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외에 피로, 어지럼증, 언어 장애, 기억력 장애 등 다른 뇌 질환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확진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될 정도로 조기 진단이 어렵다.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면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신경 손상이 축적돼 5~10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재발이 반복되면 신경은 영구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진단으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발 빈도나 정도를 낮추고 진행을 억제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장애 정도는 흔히 확장장애상태척도(EDSS)를 이용해 평가하는데 3.0 이하인 조기에 치료하면 더욱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급성기에는 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염증 억제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재발 빈도를 줄이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치료를 시행한다. 1차 치료제로 인터페론베타 주사제나 경구약제 선택이 가능하고, 1차 치료제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심하면 다른 1차 치료제나 2차 치료제로 변경한다. 최근에는 월 1회 용법의 새로운 주사제도 사용 가능해져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약 70%가 사회·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20~40대에 진단받는다. 이를 감안하면 치료의 지연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크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의 날을 계기로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중앙일보에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